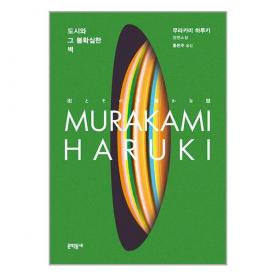책소개
〈한국과학문학상〉 〈SF어워드〉 수상 작가
황모과 신작 소설!
“이 현실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 김희선(소설가)
〈현대문학 핀 장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 황모과 작가의 『언더 더 독』이 출간되었다. 『현대문학』 2024년 3월호에 실린 동명의 중편소설을 개작해 출간한 이번 작품은 2021년에 이어 2024년 〈SF어워드〉를 받은 작가 황모과가 수상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소설이다.
“SF 문법에 익숙한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의 반응을 모두 계산에 넣은 양질의 지적 유희”(김창규)가 탁월하며, “소설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감동’을”(김보영) 선사한다는 평을 받아온 황모과의 이번 신작은 ‘태아 유전자 편집 시술’이 보편화된 미래, 편집 시술을 받지 못한 ‘비-편집인’으로서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온 ‘나’(한정민)가 자포자기해 죽으려던 순간에 편집인 ‘노아’로부터 당신의 인생을 사고 싶다는 제안을 받으며 끝없는 추락을 겪게 되는 이야기로, 편집인과 비-편집인이라는 구도를 통해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등 이분된 가치에 묵직한 의문을 던진다.
“황모과 작가의 상상 속에서나 펼쳐질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이며, 그렇기에 “오히려 더 스산한”(김희선) 소설이다.
황모과 신작 소설!
“이 현실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 김희선(소설가)
〈현대문학 핀 장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 황모과 작가의 『언더 더 독』이 출간되었다. 『현대문학』 2024년 3월호에 실린 동명의 중편소설을 개작해 출간한 이번 작품은 2021년에 이어 2024년 〈SF어워드〉를 받은 작가 황모과가 수상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소설이다.
“SF 문법에 익숙한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의 반응을 모두 계산에 넣은 양질의 지적 유희”(김창규)가 탁월하며, “소설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감동’을”(김보영) 선사한다는 평을 받아온 황모과의 이번 신작은 ‘태아 유전자 편집 시술’이 보편화된 미래, 편집 시술을 받지 못한 ‘비-편집인’으로서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온 ‘나’(한정민)가 자포자기해 죽으려던 순간에 편집인 ‘노아’로부터 당신의 인생을 사고 싶다는 제안을 받으며 끝없는 추락을 겪게 되는 이야기로, 편집인과 비-편집인이라는 구도를 통해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등 이분된 가치에 묵직한 의문을 던진다.
“황모과 작가의 상상 속에서나 펼쳐질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이며, 그렇기에 “오히려 더 스산한”(김희선) 소설이다.

목차
1장. 다운그레이드
2장. 더티 워크
3장. 언더 더 바텀
발문 : 이야기하는 인간에서 듣는 인간으로(김희선)
작가의 말 : 파멸로 달려가는 우매한 자들의 심정으로
2장. 더티 워크
3장. 언더 더 바텀
발문 : 이야기하는 인간에서 듣는 인간으로(김희선)
작가의 말 : 파멸로 달려가는 우매한 자들의 심정으로
저자소개
출판사리뷰
“우리는 미니어처 지구에 갇힌 게 분명해
생존이라는 말을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강등과 파멸의 끝,
마침내 마주한 자기 연민
태어날 때부터 우월하게끔 유전자를 편집한 편집인과 시술받을 돈이 없어 유전자 편집을 하지 못한 비-편집인. 다수이자 보통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집인과 달리 비-편집인은 사회의 ‘언더독’으로서 루저이자 골칫덩이로 여겨진다. 비-편집인인 ‘나’(한정민)는 부모가 일찍이 자살한 뒤 “완벽한 막장”의 삶을 살다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의 비-편집인들이 마지막에 오는 “개 사육장”으로 흘러든다. 그곳에서 ‘나’의 피부를 연구 목적으로 채취해 갔던 편집인 연구원 ‘노아’는 ‘나’가 죽으려 마음을 먹은 세 번의 순간마다 새로운 삶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오고, ‘나’의 “선택”을 종용한다. 그에 따라 ‘나’는 인류 피난 프로젝트의 일환인 ‘미니어처 지구’ 준비를 위한 ‘신체 신축 임상 실험’ 대상이 될 것을 선택하고, 가상인지도 모른 채 허상의 존재들을 마음에 품게 되며, 기계 장치로 옮겨져 원치 않는 학살을 이어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인간의 삶을 돌려받으나 ‘나’가 마주한 현실은 잔혹했다. 몇백 년 동안 기계로 노동하며 보냈던 세월은 실제로는 몇 개월에 불과했으며, 그동안 뇌를 무리하게 가동해 급속하게 “가속 노화”되어 몸만 늙어버린 채 버려진 것이었으니 말이다.
결말에 이르러 소설은 딱 한 차례 ‘나’에서 ‘노아’로 시점이 바뀐다. 여기서 ‘나’를 속이고 이용한 것으로만 그려졌던 ‘노아’조차 지나친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탓에 똑같이 “가속 노화”해 “10대 중반”임에도 “서른이 넘은 장년”처럼 보이는 외견을 갖고 있음이 밝혀진다. 늙은 몸으로 사육장을 나와 정처 없이 걷던 ‘나’는 “어머니가 분명할 노파”를 만나며 문득 “노아도 나도 미니어처 지구에 갇힌” 건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황모과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인간이라는 사실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것처럼, 이로써 편집인과 비-편집인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결국 우리 모두 “생존이라는 말을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것이 ‘개만도 못한 존재(언더 더 독)’의 끝없는 파멸을 통해, 『언더 더 독』이 우리에게 내놓는 “자기 연민”일 것이다. 황모과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소설의 ‘나’는 “인생의 여러 분기점에서 자멸적 선택을” 반복하는 우리의 “평행우주”(「작가의 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통의 끝, 막다른 소멸의 길 위에 다다라서야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나’라는 한 인간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통해, 상징적인 기계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려낸 소설이다.
작가의 말
제대로 변별하기만 한다면 인간이 놓인 맥락이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할까. 폭력적이고 추레하고 비루하고 역겨운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도의나 양심이나 염치 이하의 상황에도 논리나 법이나 합의로 재단할 수 없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묘한 믿음이 생기곤 한다. (……) 어쩌면 그가 내 평행우주는 아닐까. 나도 인생의 여러 분기점에서 자멸적 선택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으니.
_「작가의 말」 중에서
생존이라는 말을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강등과 파멸의 끝,
마침내 마주한 자기 연민
태어날 때부터 우월하게끔 유전자를 편집한 편집인과 시술받을 돈이 없어 유전자 편집을 하지 못한 비-편집인. 다수이자 보통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집인과 달리 비-편집인은 사회의 ‘언더독’으로서 루저이자 골칫덩이로 여겨진다. 비-편집인인 ‘나’(한정민)는 부모가 일찍이 자살한 뒤 “완벽한 막장”의 삶을 살다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의 비-편집인들이 마지막에 오는 “개 사육장”으로 흘러든다. 그곳에서 ‘나’의 피부를 연구 목적으로 채취해 갔던 편집인 연구원 ‘노아’는 ‘나’가 죽으려 마음을 먹은 세 번의 순간마다 새로운 삶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오고, ‘나’의 “선택”을 종용한다. 그에 따라 ‘나’는 인류 피난 프로젝트의 일환인 ‘미니어처 지구’ 준비를 위한 ‘신체 신축 임상 실험’ 대상이 될 것을 선택하고, 가상인지도 모른 채 허상의 존재들을 마음에 품게 되며, 기계 장치로 옮겨져 원치 않는 학살을 이어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인간의 삶을 돌려받으나 ‘나’가 마주한 현실은 잔혹했다. 몇백 년 동안 기계로 노동하며 보냈던 세월은 실제로는 몇 개월에 불과했으며, 그동안 뇌를 무리하게 가동해 급속하게 “가속 노화”되어 몸만 늙어버린 채 버려진 것이었으니 말이다.
결말에 이르러 소설은 딱 한 차례 ‘나’에서 ‘노아’로 시점이 바뀐다. 여기서 ‘나’를 속이고 이용한 것으로만 그려졌던 ‘노아’조차 지나친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탓에 똑같이 “가속 노화”해 “10대 중반”임에도 “서른이 넘은 장년”처럼 보이는 외견을 갖고 있음이 밝혀진다. 늙은 몸으로 사육장을 나와 정처 없이 걷던 ‘나’는 “어머니가 분명할 노파”를 만나며 문득 “노아도 나도 미니어처 지구에 갇힌” 건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황모과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인간이라는 사실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것처럼, 이로써 편집인과 비-편집인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결국 우리 모두 “생존이라는 말을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것이 ‘개만도 못한 존재(언더 더 독)’의 끝없는 파멸을 통해, 『언더 더 독』이 우리에게 내놓는 “자기 연민”일 것이다. 황모과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소설의 ‘나’는 “인생의 여러 분기점에서 자멸적 선택을” 반복하는 우리의 “평행우주”(「작가의 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통의 끝, 막다른 소멸의 길 위에 다다라서야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나’라는 한 인간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통해, 상징적인 기계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려낸 소설이다.
작가의 말
제대로 변별하기만 한다면 인간이 놓인 맥락이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할까. 폭력적이고 추레하고 비루하고 역겨운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도의나 양심이나 염치 이하의 상황에도 논리나 법이나 합의로 재단할 수 없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묘한 믿음이 생기곤 한다. (……) 어쩌면 그가 내 평행우주는 아닐까. 나도 인생의 여러 분기점에서 자멸적 선택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으니.
_「작가의 말」 중에서
상품필수 정보
- 도서명
- 언더 더 독 (마스크제공)
- 저자/출판사
- 황모과 ,현대문학
- 크기/전자책용량
- 104*182*20mm
- 쪽수
- 164쪽
- 제품 구성
- 상품상세참조
- 출간일
- 2024-09-25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품상세참조